무료 유튜브 뮤직 사라진다온라인서 공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로 인해 유튜브 뮤직 이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www.wowtv.co.kr
한국 경제 인터넷 뉴스 기사를 발췌해왔다. 뭐 한경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단순히 여론의 흐름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YouTube Music Premium)이란?
본래 "유튜브 뮤직" 이라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가 있다. 다만,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때는 몇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1. 주기적으로 광고를 시청해야 한다
2. 백그라운드 재생이 되지 않는다 → 노래를 들으면서 다른 액션을 할 수 없다. 멀티태스킹 불가
3. 음악 오프라인 저장 불가
4. 블루투스 전송 불가 → 외부 스피커, TV 등으로 음악 전송 불가, 휴대폰으로만 들어야 함
이런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감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유튜브 뮤직"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며, 반대로 구독을 통해 월별 일정액을 지불하면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등급이 되어, 위의 제약사항 없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프리미엄 서비스의 골자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유튜브뮤직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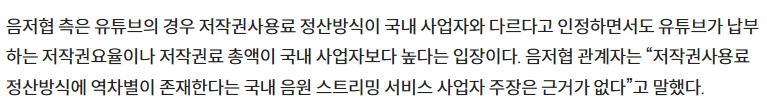
국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규정한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하고 있다. 단, 해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법을 따르기 때문에, 해외 사업자 역시 사업 등록된 국가의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결국 유튜브뮤직은 음저협과 별도 계약을 맺고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정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멜론, FLO 등)는 여기에서 자신들이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음저협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망 사용료"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를 가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일상 같지만, 그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뒤에서는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쌀을 생산하는 생산자가 유통업자를 통해 전국의 마트에 자신이 만든 쌀을 제공하게 되고, 마트에서는 이를 소비자에게 유통비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유통비를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해요?!" 라고 묻겠지만, 답은 사실 정해져 있다. "그럼 너가 직접 가서 구매해 와."
기본적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IT 서비스 기업(CP, Contents Provider)도 위와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 우리는 단순히 크롬 등 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유튜브, 멜론 등을 통해 음악을 듣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을 위해 많은 과정을 거친다. 저작권자는 음악을 창작하고 이를 유통업자인 인터넷으로 CP(네이버, 카카오 등)를 통한 플랫폼 형식으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인터넷 유통업자인 SKT, KT, LG유플러스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망 사용료" 라고 한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CP(Contents Provider,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설치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이에 국내CP들은 통신사들과 계약을 맺고 망 사용료(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가 통신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2016년 약 734억원, 2017년 약 1141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네이버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이와 같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vop.co.kr/A00001600774.html 2021. 10. 24. 민중의소리
이 망사용료는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만 하더라도 약 1141억원(네이버가 3사 통신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 총액)이라고 한다. 트랙픽 양에 비례해서 늘어난다고 하니, 해마다 늘어날 것이므로 2024년에는 3000억이 넘는 금액을 지불했을 수도 있다.
다만, 이 "망 사용료"의 경우 해외 사업자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기업 간 계약, 상품 거래이므로 법으로 이를 통제하지 않을 뿐더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컨텐츠 제작 또는 소비 비중이 얼마나 크겠는가. 우리나라 전국민이 이용해도 중국 상하이, 베이징 두 도시에서만 소비하는 것보다 비중이 작다. 그러니 항상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우리는 그들에게 국내 사업자와 같은 형태로 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구조차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저작권료의 경우는 누가 이득을 보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망 사용료에서만큼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니, 국내 음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들도 할 말은 있다.
공정위는 무엇을 문제 삼은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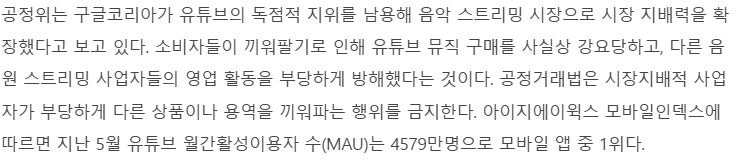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유튜브의 지위를 남용하여 유튜브 뮤직의 구매를 강매하고 다른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문제를 삼은 것이 위에서 살펴 본 "망 사용료" 나 "음저협과의 저작권 사용료 부당 계약" 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유튜브 프리미엄에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끼워 팔았다." 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
1. 엄밀히 이야기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문제 삼은 것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계란 값이 폭락했다는 이유로 만약 쌀을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계란 한 판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정당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실질적으로도 그래야 한다. 계란을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쌀을 사면 계란을 서비스로 드려요!" 라고 하면서 계란을 끼워팔아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는 이 점을 지적한 것. 유튜브만 이용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유튜브 뮤직도 사실상 끼워팔아서 "강제로 구입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모두가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뮤직은 따로 결제가 가능함에도 유튜브 프리미엄만 따로 결제가 불가능한 것은 확실히 위의 구입 강제의 의도를 띄고 있다고 충분히 해석할 여지가 있다.
2. 해외 서비스와의 차별점과 관련하여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들을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음원 플랫폼 회사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이를 반대했다." 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그럼 반대로 유튜브 뮤직이 공짜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듣는 우리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지만, 유튜브 뮤직은 그렇지 않다. 망 사용료는 둘째치더라도 당연히 저작권료를 우리나라에 지불해야 한다.
한국음반산업협회 사용료 징수 규정
제4조(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④ 제1항 내지 제3항과 달리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소비자가 음악저작물을 청취할 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저작물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이하 ‘광고수익 기반 스트리밍 상품’이라 한다)의 사용료는 제1호와 같다. 다만, 그 금액이 제2호보다 적을 경우 제2호로 한다.
1. 3.38원(곡당 단가) × 이용횟수
2. 매출액 × 48.25%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최근 공개된 2024년 4월 MAU(Monthly Active Users, 월간 이용자수 지표) 지표를 살펴보자

당연히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가 더 많겠지만,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743만명이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만 결제했다고 가정(월 11,000원)해도 월 매출액 817억이며, 위의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르더라도 최소 월 394억(매출액의 48.25%)을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도 단순히 구독료로만 계산했을 때의 이야기
무료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료로 비용을 대신하겠다는 뜻인데, 유튜브에서 광고주가 요청한 광고를 천 번 노출시킬때마다 지불하는 비용인 CPM(Cost Per Mille)은 상당히 낮은 축에 속한다. 통계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 대부분 개인 유튜버들이 자신의 CPM을 개제해놓아서 외부링크를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 직접 검색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기에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많고, 반대로 그로 인해 벌어들일 수익은 타 국가에 비해서 적다. 결국 순이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매출액에 비례해서 지불해야하는 저작권료의 구조는 굳이 이 곳에서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무료로 서비스를 해야할 이유마저도 없게 만든다. 왜냐? 이용자가 별로 늘지 않아도 매출액이 많이 늘어나면 정작 지불해야하는 저작권료가 늘어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
물론 여러 규제와 국내 기업의 등쌀에 밀려 무료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돈이 안되기 때문"이지,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공정위의 지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문제는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이며, 최초에 유튜브 뮤직이 우리나라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한한 이유가 공정위나 플랫폼의 견제로 선택한 정책도 아닌, 수익의 문제가 크다.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결합하지 않더라도 따로 11,000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지적으로 인해 유튜브 프리미엄 11,000원 따로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11,000원 따로 가격정책이 결정되더라도 반대로 생각하면 유튜브 뮤직을 이용하지 않고 유튜브만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3,000원이 싸지는 결과를 낳는다. 뮤직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어쩌겠는가, 기업이 광고비를 적게 내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그렇다고 CPM이나 기업이 광고를 통한 수익-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은 있는가? 그냥 "공정위 지적으로 유튜브 뮤직 무료로 못 들을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이 조회수 개선엔 더 큰 도움인 걸